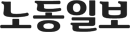[노동일보] 노동일보가 본 사이비기자 및 매체들의 행태는 다양하다. 특히 소규모 인터넷 신문들의 사이비 행태는 극에 달한다.
물론 정직하고 정론지를 지향하는 인터넷 신문들도 상당수 많다. 또한 인력이 적어도 소규모 인력으로 열심히 취재하며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도 많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 놓고 사이비 행태를 하는 대표와 기자도 적지 않다.
최근 인터넷신문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언론의 본질을 무시한 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이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소자본으로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후 광고를 따려는 행태가 거의 양아치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이런 사이비 대표와 사이비 기자들은 사실상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A매체의 박 모 대표는 직접 광고를 따면서 편집국장에게 기사와 광고를 딜하자는 행태를 요구하고 딜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
결국 박 모 대표는, 아예 (편집국장에게) 조지(까는)는 기사를 써달라는 등 광고와 연계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한다.
여기에 정상적인 언론인 출신의 편집국장이라면 박 모 대표와 언쟁을 하며 대립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편집국장이라면 같이 동조하면서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행태를 자행한다.
특히 박 모 대표는 그러면서 주요 M, H 경제지와 후발 주자인 M, E, A 경제지들도 그렇게(조지는 기사로 광고를 딴다)한다며 꼭 뒷 말을 한다.
여기에 박 모 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S인터넷신문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조지는 기사를 써주면 기업에게 (박 모 대표가 곧바로)전화를 건다.
또한 박 모 대표는 조지는 기사를 쓰면 역으로 기업에서 전화가 온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이비 짓을 자랑한다.
이어 (편집국장에게)기사를 빼달라고 하고 광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사와 딜을 해달라고 한다.
결국 조지는 기사를 쓴 후 기업이 알아서 광고를 집행하도록 은근한 강제성으로 광고를 뜯어내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더욱이 박 모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그룹 회장의 주식 문제와 회장 가족들의 비리를 찾아 기사를 쓰면 광고가 들어온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한다.
이에 일부 사이비 편집국장들은 이런 요구에 동조하며 돈을 벌려고 비리를 찾아 헤맨다.
결국 비리를 찾아 취재 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가 아니라 광고와 금품을 뜯어내기 위한 기초를 다지며 기업들의 홍보실에 전화를 건다.
여기에 박 모 대표는 기사의 주된 소재는 기업의 오너와 최고경영자와 관련된 것으로 주가 등 회사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오너의 자식, 손자 등의 (주식)비리 등을 대놓고 써달라고 요구한다.
또한 B매체의 L 대표는 홍보실 등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흘리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를 흘려, 기사가 나가기 전에 홍보팀에 미리 알려주고 광고를 받아내려는 행태를 보이며 (홍보실에서)광고를 주겠다는 말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런 기사를 쓰는데 회사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며 취재의 형태를 빌려 물어본다.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이런 인터넷신문이 광고 때문에 기사 쓰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굳이 기사를 노출시키기 전 홍보실로 전화하는 것을 모르겠다"며 "결국 광고를 달라는 행위 아니냐"고 일갈했다.
특히 홍보실 관계자는 "이런 기사를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며 광고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매체도 있다"고 말했다.
C매체의 K 대표는 홍보실로 찾아가 대놓고 광고를 달라고 요구한다.
광고·협찬 건으로 대놓고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섭섭하게 하면 앞으로 서로 안좋지 않겠냐며 협박성 발언도 한다.
한 대기업의 임원은 "이런 (공갈하는)대표에게 전화가 와, 전화를 피하면 곧바로 사람 무시하는 거냐. 조지는 기사가 여러개 있다. 나중에 후회한다. 안봐준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온다"며 "무슨 언론사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양아치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실제로 광고나 협찬을 협조 안해서 감정이 (서로)상해 기사 보복을 당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데 없이 조지는 기획기사로 사실과 떨어진 이야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
기사 내용이 (사실과)완전히 틀린 경우는 많다. 하지만 일단 보도가 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기업이다.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불편하고 이미지가 손상된다.
결국 기업이 피해자임에도 (인터넷신문사를)찾아가서 해결한다.
여기에 D매체의 C 대표는 홍보실로 찾아가 애걸하는 식으로 광고를 딴다.
매체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자평과 함께 홍보실을 찾아가 광고를 달라고 허리 굽혀 이야기 한다는 것.
결국 인정에 의한 광고 집행을 부추킨다.
한 대기업 홍보실 임원은 "주요 언론사에 있다가 퇴직한 후 작은 신문사나 인터넷매체로 간 기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냐? 이런 상황에서 옛정을 생각해서 몇 번 광고를 집행하지만 계속 줄수는 없다. 하지만 찾아와 애걸하는 데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애걸형은 기자와 직원도 없이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혼자)기업체를 찾아다니며 광고를 따며 수익을 이어가는 매체다.
E매체의 L대표는 다른 인터넷 신문들의 대표들과 그룹으로 다니며 기업과 건설 현장, 마트 등의 비리를 찾아 다닌 후 공동 보도를 한다고 홍보실을 찾아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L 대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같은 부류의 인터넷 신문 대표들과 삼삼오오 몰려 다니며 홍보실을 찾아간다.
특히 이들은 홍보실 담당자를 만나 최고 경영자를 들먹거리며 최고 경영자의 카더라식의 의혹을 부추긴다.
이에 대해 홍보실 담당자는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며 "최고 경영자 이름을 들먹이며 (카더라식의)소문이 있나 라고 간을 보듯이 질문을 한다.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줄 알면서 정중하게 아니다라고 답변해 준다"고 말했다.
홍보실 담당자는 또 "이런 인터넷 신문 대표나 기자인 줄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인터넷 신문 대표들이 찾아 온다니까 만나 보았는데 아주 저질들이다. 두번은 만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실 담당자는 "하지만 이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와 또 만나자고 한다. (하지만)만나주지 않을 경우 뒤에서 욕을 한다"며 "홍보실 담당자가 자격이 부족하다는 식의 말을 퍼뜨린다"고 일갈했다.
<연락하실곳> 노동일보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 02-782-0204